“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
더불어 살고싶은 제 꿈입니다”
장애인 공동체 사역 중 만난 ‘도가니’ 사건 … 대책위 상임대표 맡아 전방위 활동
‘덮고 가자’며 암묵적 가해자되는 사회 부끄러워 … “교회, 소외 돌보는 동력돼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9회 총회가 열리던 9월 25일 저녁 7시, 광주겨자씨교회 뒤편 아파트 단지에서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골목길 음악회’란 부제가 붙은 이날 행사는 초대가수는 말할 것도 없이 200명 가량의 관람객들은 격식없이 환호하며 즐겼다. 마치 음악동호회 모임을 보는 것 같았다.
<실로암사람들>이 주최한 가족같은 분위기 속의 골목길 잔치는 벌써 20회째를 맞았다. 봄 가을 1년에 두 차례씩 실시하니까 음악회를 연 지도 10년이 됐다. 이렇게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가는 <실로암사람들> 중심에 김용목 목사(52)가 있다.
그는 장애인이다. 5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지체장애인이 된 후 장애의 짐을 외면하고 싶어 줄곧 장애인을 피하며 살았다. 외톨이처럼 생활했다. 대학교를 다닐 때도 교내에 장애인 동아리가 있었지만, 가입하지 않았다.
누군가 나를 향해 조롱거리며 쑤군거리는 것 같아 싫었고, 장애를 가진 사람과 어울리는 것 또한 패배자 같아 매우 싫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을 외면했다. 하지만 마음 한 켠에서는 늘 장애인에 부채의식 같은 것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 짐은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회한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강도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실로암에서 장애인 사역을 전담할 목회자를 찾고 있었다. 비록 장애인을 돌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부채를 덜 요량으로 실로암에 발을 디뎠다. 그렇다고 그때는 장애인 사역을 평생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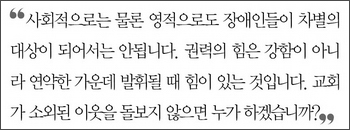
“재가 장애인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장애인 부모님을 만나 교육 생활 등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도 장애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장애인의 애환을 들으며 지금까지 응어리진 감정들이 실타래처럼 조금씩 풀리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어설픈 자존감도 내려놓았다. 그리고 어쩌면 이 ‘자리’가 평생 있어야 될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목회에 자신감이 붙었지만, 결코 장애인과 동 떨어져 살 수는 없었다. 그래서 1년 정도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접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 정착했다. 그리고 23년이 흘렀다.

1976년에 창단된 <실로암사람들>은 광주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다. 장애인 단체로 출발은 했지만, 소식지 ‘실로암’ 발간부터 중창단 민들레도서관 수화학교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이 공동체를 느끼며 생활하도록 도움을 주고, 재활원과 자립센터를 설립하여 장애인들이 삶을 일구며 사회에 적응하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또다른 터전이었다. 김 목사는 <실로암사람들>에서 장애인과 어우러져 뿌리를 내렸다.
2000년이 되자 그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수화를 배웠다. 공인수화통역사 자격도 땄다. 그런데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할 줄 몰랐다. 2005년의 일이다.
“인화학교 사건이 지역에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화를 몰랐다면 이 일에 개입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수화가 연결해 준 운명같은 것을 느끼면서 인화학교 사건을 접했습니다.”

그는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상임대표를 맡았다. 농아인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사건을 접하면서 현장에서 목격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분노가 일기도 했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정도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는데 왜 유독 광주에서만 유난을 떠느냐는 따가운 눈초리도 있었다. 쉽게 말해 이 정도 했으면 덮고 가자는 의견들도 많았다.
“<실로암사람들>에서 매년 통합캠프를 실시합니다. 올해 1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저희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때 자괴감이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아픔을 보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나름대로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이들도 합세하여 가해자가 되었다는 것이 못내 서글펐다고 말했다. 사실, 알고 보면 소설이나 영화보다 인화학교 사건은 더 광범위 하고 심각했다고 한다. 경찰조사 피해자만 30명일 뿐이지, 피해당사자 가족들이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도가니의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김 목사는 말한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방을 해야 하는데 창피하다고 쉬쉬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알아야 합니다.”
그는 인화학교 사건을 모르는 척 묻어두지 않고 꺼낸 것은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유린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세상에 알렸다고 한다. 아픔은 컸지만 사회가 관심을 갖고 장애인 성폭력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점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인화학교 사건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장애인상담소에서 치료를 받는 자가 아직도 상당 수에 이른다. 외상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만도 14명에 이른다. 어쩌면 이들의 아픔은 치유되지도 못한 채 평생 갈 지도 모른다.
“사회적으로는 물론 영적으로도 장애인들이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권력의 힘은 강함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발휘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는 장애인의 삶이 현실적으로 척박하고, 정책적으로 미비한 것이 사실이지만, 풀어가는 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모으고 훈련하여 홀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도가니’ 영화는 비록 끝났지만, 그는 <카페홀더> 사회적 협동조합을 창립했다. ‘홀로 삶을 세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뜻에서 이름도 홀더로 지었다.
그는 23년 전 <실로암사람들>에 발을 디딘 때부터 여태까지 장애인들이 평생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 소망이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나 인권이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다지만, 아직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할 일’이 많다.
“장애인 사역을 실시하는 대표이기 전에 저도 목사입니다. 교회가 이런 부분의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목길 음악회를 마저 준비하겠다며 나서는 그의 발걸음이 유난히 상큼해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