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석 목사(예현교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요 1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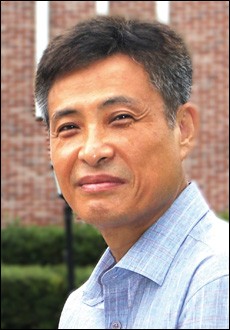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던 이들은 연안 여객선인 아드라뭇데노에 몸을 실었다. 에게해에서 갈아탈 목적으로 시돈을 떠나 보다 안전한 길인 구브로의 해안선을 선택해 무라에 도착했다. 여기서 애굽의 곡물을 싣고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탔으나 니도까지 역풍을 만나 수일을 허비하다 미항에 도착하지만, 겨울을 나기에 뵈닉스가 낫다는 생각에 하룻길을 선택했다가 그만 광풍을 만난다.
여기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장르가 등장한다. 사도 바울을 위해 광풍을 붙잡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복을 받으라는 그것이다. 이렇게 수련회 말씀을 이어 가다 어린 중학생에게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처음부터 로마로 안 가게 하시는 게 축복이지요! 하나님은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드시죠?” 맞다! 우리는 광풍과 기적에 시선이 몰려있었다. 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치적인 선교여행 이야기보다 공판과 항해 이야기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했는지 돌아봤어야 했다.
누가의 의도는 분명하다. 2년간의 구류 생활과 죄인으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그에게 광풍이라는 시련까지 더 하시는 하나님의 모진 역사, 그럼에도 자신을 포기하거나 염세적 자세 없이 불굴의 에너지로 역할을 감당해 내는 바울의 역동성을 소개하고 싶었을 뿐이다. 사실 사도 바울만큼 인생의 처참한 성적표를 받은 사람은 없다. 유대인으로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고, 태장을 세 번 당하고 한 번은 돌로 맞았다. 세 번 파선하고 강도와 동족과 광야와 바다의 위험과 싸우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기까지 했다.(고후 11:24~27) 결국 죄인의 신분으로 생을 마감해야만 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복은 찾을 수가 없다. 그는 복을 받기 위해 견딘 것이 아니다. 큰 상급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것도 아니다. 그의 여정에 중요했던 것은 로마 자체가 아니라 성령이 부르신 바로 그곳이다. 광풍 속의 배에서도 성령이 계셨다.
우리는 각자 삶이라는 항로에 로마라는 목적을 갖고 항해를 떠난다. 비즈니스석에 몸을 싣고 자신의 안전과 편안한 항해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광풍이라는 시련의 유무가 가장 큰 관심거리일 것이다. 부름 앞에 놓인 우리에겐 광풍이건 잔잔한 바다이건, 비즈니스석이건, 화물칸이건,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무를 위해 그곳에 서 있느냐는 것이 관건이다.
누가는 당시 독자였던 사랑하는 데오빌로와 그의 공동체에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한다. “너희도 바울처럼 이 길을 가야만 한다.” 누가의 속삭임에 이 밤 더 없는 부끄러움으로 글을 접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