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석 목사(예현교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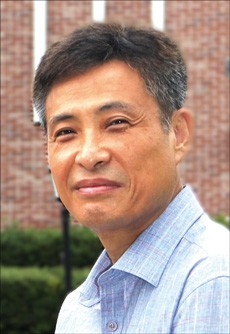
요한은 서신의 초두에서 독자들에게 새로운 명제를 던진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연계하는 중재적 역할로서 최고의 이데아를 말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정신(der Geist)이 물질(die Substanz)이 되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정신과 물질이 우리가 사는 물리적 공간에서 혼용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현상, 아니 가능성조차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인문학적 이해가 없다면 이 용어는 궤변에 가깝게 들린다. 왜 요한은 난해한 형이상학적 담론을 자신의 서신에 갖고 들어왔을까? 어려운 헬라철학의 개념을 사용한 이유는 독자가 학식이 풍부한 상류층이기 때문일까?
아니다! 본 서신에서 이 용어 외에 헬라철학의 흔적은 없다. 오히려 문체는 셈족 체계 아래 아람어의 흔적으로 가득해 문장구조와 관계절 이해에 전문가들도 어려움을 겪는다. 다시 말해 토속 언어에 젖어있는 평범한 어부와 목동들 같은 유대인들을 위한 서신이라는 것이다. 미루어 보건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배움이 부족한 일반인이라 해도 이 정도의 헬라철학 개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삼위일체의 교리 또한 그렇다. “본체는 하나이신데 그 위가 각각 세 분이시다.” 전형적 문형 이탈이다. 한 분과 세 분이 어떻게 등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단 말인가! 신학적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 듣는다면 이 또한 말장난에 가깝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요한이 구속되지 않고 이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던 이유다.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 자기 이해력을 총동원한 결과이다.
바쁜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간혹 내게 이렇게 묻곤 한다. “목사님, 간단하고 쉽고 재미있는 성경 공부는 없을까요?” 나는 늘 이렇게 답한다. “간단하고 쉽고 재미있는 성경 공부는 없다. 그런 설교도 없다. 있다면 이단들의 트릭일 뿐이다.”
그리고 덧붙여 말한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 기능화된 새로운 도구를 만날 때마다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핸드폰 기능을 알아가고 새로 구입한 자동차의 디지털 계기판 작동에 익숙해 갈 때 즐거움을 느낀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기 위해선 에너지를 소모하지는 않는다. 말씀과 복음을 소개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상대방의 거부감을 높이기도 한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십분의 일만 노력해도 말씀 속에 살아 숨쉬는 성령의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을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