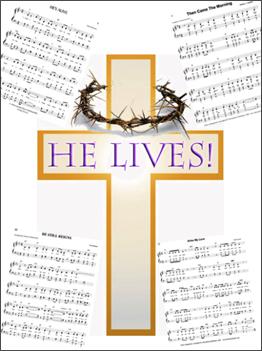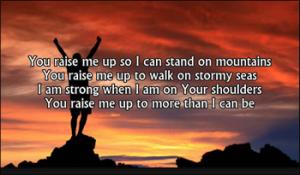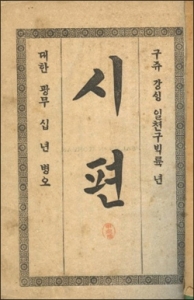“자, 앞에 놓인 찬송가 3곡 중에서 하나를 노래하면 돼요.”
“저... 교수님... 이 찬송가들... 다 모르겠는데요.”
“간단한 곡들이고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가들인데... 그럼 본인이 아는 찬양곡 아무거나 하나 불러줘요.”
그러면 대부분은 <완전하신 나의 주(예배합니다)>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찬양과 경배(Praise and Worship)’ 곡을 부른다. 몇 년 전부터 필자가 매 학기 초마다 학교에서 채플 콰이어 오디션을 진행할 때 적어도 한, 두 차례 이상 경험하는 장면이다. 그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그래도 명색이 총신대학교에 들어온 학생인데 이런 기본적인 찬송가도 모르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하긴 요즈음 교회 중, 고등부에서 찬송가를 잘 부르지 않으니 그럴 법도 하지….’
오늘날 한국교회는, 특히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안타깝게도 전통적인 찬송가를 잃어가고 있다. 교회에서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나 ‘찬양과 경배’ 곡들을 주로 부르다보니 찬송을 부를 기회도 별로 없다. 그나마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른다고 해도 비교적 적은 수의 곡들만 제한적으로 부르다보니 찬송가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필자도 물론 여러 CCM 곡들과 ‘찬양과 경배’ 곡들을 좋아하지만, 전통적인 찬송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찬송가는 우리가 계승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기독교 신앙의 고귀한 유산’이기 때문이다.
현행 한국찬송가에는 2세기 라틴어 찬송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영광송(小榮光頌)’인 <성부 성자와 성령(Gloria Patri)>(3, 4, 7장)부터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인물들인 성 암브로시우스(130장), 그레고리우스 1세(59장), 성 프란치스코(69장), 토마스 아퀴나스(230장), 마틴 루터(363, 585장), 존 칼빈(548장), 그리고 탁월한 개신교 찬송작가들인 아이작 와츠(6장 외 11편), 찰스 웨슬리(15장 외 12편), 파니 크로스비(31장 외 21편) 등의 찬송들이 담겨 있다. 또한 초기 한국선교를 위해 헌신한 배위량(Annie A. Baird; 375, 387장), 피득(A. A. Pieters; 75, 383장), 민로아(F. S. Miller; 96장 외 4편), 소안련(W. L. Swallen; 326장) 선교사의 찬송들과 길선주(11장), 주기철(158장), 손양원(541장) 목사의 찬송들도 실려 있다.
이처럼 찬송가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신앙적 기록이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양과 기도, 고백의 결정체이다. 이 찬송가를 통해 기독교회는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가르쳐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찬송가가 요즈음 교회 안에서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검증된 이 ‘기독교 신앙의 고귀한 유산’을 한국교회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송가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절망 중에 위로와 격려를 받고 고난 중에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확신하게 된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그 소중한 신앙적인 체험을 찬송가를 부르면서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누고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을 그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은 아닐까?
<총신대 교회음악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