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선 목사(주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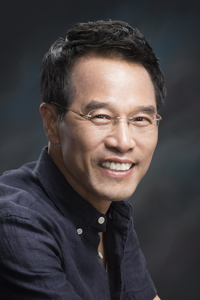
지난주일 고 장기려 장로 추모예배를 드렸다. 1995년 성탄절 아침에 천국 가신 그분의 삶을 잇자는 의미로 매년 하는 일이다.
지금도 생생한 기억. 성탄절 새벽예배 후 부음을 들었다. 그분이 섬기던 서울대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송별했다. 서울 백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뵈었던 얼굴이 생생했다. 따뜻한 목소리로 젊은 목사를 격려하시던 그분을 그렇게 떠나보낸 지 27년이다. 교회 부임 후 첫 성탄절에 맞은 일이기에 더욱 잊지 못한다. 당시 이런 생각을 했다. 왜 하필 성탄절 아침일까? 아마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의미와 삶을 가장 잘 담아냈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성탄절에 들뜬 채 세상의 즐거움만 좇지 말고 주님 닮은 삶을 생각하라는 깨우침이었을 것이다.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는 묘비의 문구는 천국 가기 두 달 전, 그분의 유언이었다. 그것을 난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교회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웃을 섬기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 성탄 헌금을 그렇게 사용하고, 그분을 기념하는 의료봉사 등을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주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 어느새 교회가 본질을 잃은 듯하다. 수백수천만원짜리 화려한 성탄 장식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모신다며 화려한 예배당을 짓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일까? 장기려는 그 답을 주셨다.
그분 소천 당시 전직 대통령의 수백수천억 비자금 관련 소식이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런데 그분의 소천으로 확 바꿨다. 그 고귀한 삶을 조명하는 기사 등이 더러운 뉴스를 밀어냈다. 욕심에 찌든 권력자와 섬김의 삶을 사신 분은 대조적이었다.
나의 삶 곳곳에 내가 섬길 주님이 있다. 손잡아야 할 작고 힘없는 이웃이 내가 섬길 주님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성탄절의 의미는 구체화한다. 교회, 그 자체가 아닌 주님께서 관심 갖는 ‘이웃’을 섬겨야지. 그러면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아도 마음만은 평생 주님을 섬기다 가고 싶다. 초라해 보여도 그런 교회를 가꾸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