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선 목사(주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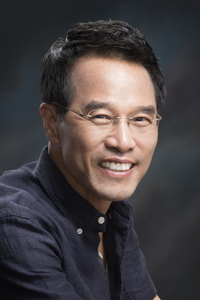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 <한국이 싫어서>는 장강명의 소설을 영화화 한 것이다. 주인공 ‘계나’는 정글 같은 한국에서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에 호주로 가게 된다. 강자가 우대받는 세상, 생태적 경쟁력이 없어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강박이 한국을 싫어 하게 했다. 그런데 한국만 싫을까? 이 사람 저 사람과 사랑이 싹터 함께 살아볼까 싶다가도 결국 떠나면서 어디 한곳 마음 두기 어려운 주인공. 요약하기 힘든 작품이지만, 오늘의 한국 사회를 사는 젊은이들의 아픔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싫어서’ 떠나면, 만족스럽게 살 곳은 세상 어디에 있을까? ‘여기다’ 싶어도 실망할 일은 또 이어지기 마련이다. 세상 어디가 완벽하게 만족스러울까? 언젠가 많이 불렀던 복음송이 있다. “저 천국 아니면 난 어떻게 하나~ 나는요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교회가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다니!
어디서든 행복하려면 싫은 곳을 떠나기보단 있는 곳을 사랑해야 한다. 만족스럽진 않아도 분명히 좋아할 만한 것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으로 견디고 사랑하다 보면 대단한 기쁨은 아니어도 소소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행복은 강도보다 빈도’라는 표현을 본 <랩소디>에서도 쓴 적이 있다. 작지만 꾸준히 이어지는 즐거움,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다.
목회에서 겪는 아픈 경험 중 하나는 교회가 싫다며 떠나는 이들을 보는 것이다. 더욱 슬픈 것은 목사가 싫다며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언제는 목사님 좋아서 평생 살겠다더니 한 번만 섭섭해도 마음이 뜨고 만다. 그가 싫어하는 사람이 된 나는 공연히 미안하다. 이러다 주님도 나를 싫어하면 어쩌나 싶지만 주님이야 그럴 리 없다 싶어, 안심이다. 나의 약하고 모자란 것까지 사랑해주는 분이시니.
누구라도 날 싫어하지 않도록 목회 서비스를 잘하고 싶다. ‘목사님 좋아서 이 교회 다녀요’라는 위험한 말을 듣고 싶지는 않다. 그냥 열심히 사랑하며 살기로 한 지 이미 오래다. 비록 짝사랑일지라도.
<한국이 싫어서>의 주인공 ‘계나’가 말한 “난 이제부터 진짜 행복해질 거야”라는 결심이 제발 이루어지길 빈다. 어디든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행복에 도달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