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선 목사(주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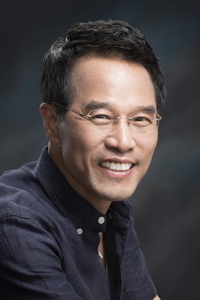
난 아침 6시에 시작되는 기도회를 위해 4시에서 5시 사이에 예배당에 올라간다. 그러나 일찍 깬 날은 그보다 훨씬 캄캄한 시간에 나가기도 한다. 예배당 가는 그 시각, 그 길에 펼쳐지는 밤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이른 새벽에 움직이는 청소차는 쓰레기 치우는 작업이 바쁘다. 또 택배 배달원들의 바쁜 걸음은 ‘새벽 배송’이라는 광고카피를 뒷받침한다. 배송 차량의 배기음과 배달원의 바쁜 손발이 고객에게 주문 상품을 안겨주는 것이다. 또 잉크 냄새 가득한 신문을 읽을 수 있도록 배달하는 이들이나, 경광등을 번쩍이며 요란하게 달리는 구급차도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겨울철, 밤새 염화칼슘 살포하느라 분주한 이들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밤 풍경이 많은 사람이 상쾌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리라.
그러고 보니 내가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간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아니다. 여러 분야에서 밤잠을 잊은 사람들이 바쁘게 뛰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자의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밤 풍경 덕에 난 매일 아침 ‘굿모닝’이다.
그 밤 풍경을 보며 드는 생각. 나 역시 아무도 볼 수 없는 시간의 수고로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싶다. 또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하루를 열게 하고 싶다.
한밤중이나 이른 새벽에 예배당에서 엎드려 기도하거나 말씀 묵상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습관이다. 그것은 우선 나를 유익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게 맡기신 교회 식구들을 즐겁게 할 수 있다. 긴 밤을 지새우며 흘린 눈물과 몸부림이 목회자인 내가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못 보는 시간에 흘린 나의 땀과 눈물, 그리고 조용한 몸짓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자주 확인한다. 더 아름다워지는 교회, 더 행복해지는 교인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섬기는 모든 이들을 신나게도 한다.
그러니 이른 새벽 눈이 떠졌을 때, 잠 설쳤다고 불평만 할 일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주님만 아시는 그 시간에 나의 움직임이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답기를 기도한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로 스스로 피곤하게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위로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입꼬리가 올라간다. 오늘따라 밤 풍경이 더 아름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