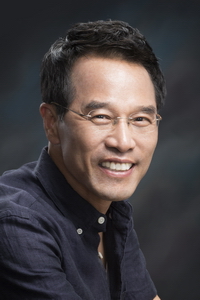
점차 날이 더워지면서 시원한 빙수가 생각난다. 더위를 식혀주는 최고의 아이템이 아닐 수 없다. 빙수하면 빙삭기를 장착한 손수레에서 얼음을 갈고 팥을 올려주던 그 시절의 길거리 음식이 떠오른다. 그것조차 사치스러워 쉽게 먹기 힘든 사람들은 땀방울을 말릴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어떤 호텔의 빙수값이 무려 12만6000원이나 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그 가격만 봐도 등골이 오싹해지니 굳이 빙수를 먹지 않아도 될 듯하다. 10만원이 넘는 빙수값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그만큼 심화되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다.
‘시급 1만원 시대가 가능할까’라는 논란이 이는 때에 그 시급의 열 배도 넘는 빙수는 누가 먹는 것일까? 굳이 비싼 빙수값을 가지고 시비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나도 가끔은 고급호텔에서 비싼 식사를 대접받다 보니 무뎌지고 있는 건전한 상식을 되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예수님이 낮은 중에도 가장 낮은 곳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난 예수님 덕에 높고 높은 곳이 어느새 익숙해지는 것 같아 갑자기 어지럽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10만원이 넘는 빙수를 아무런 생각 없이 먹으며 으스대는 내 모습을 주님이 보고 있다는 것조차 잊을지 모르겠다.
강남 한복판, 부자들이 밀집한 곳에서 목회하다 보니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질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다. 그래도 10만원 넘는 빙수값에 가슴이 떨리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지난 주간 아이티 난민을 치료하고 자기 나라 문자를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이들을 공부시키는 도미니카 선교 현장에 다녀왔다. 달라도 너무 다른 세상이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 듯싶다. 그런 곳에 오가며 오랜 비행과 경유지 공항에서의 밤샘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은 이미 편안하고 화려한 삶에 익숙해진 증거가 아닐까 싶다.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의 대표적 음식인 순대국밥 가격이 지난해 말 기준 평균 9633원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올핸 분명히 1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즈음에 빙수값에 놀랄 수 있어야 살아있는 목회자가 아닐까 싶다. 혹시라도 고급 식당과 화려한 카페 분위기에 익숙해질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