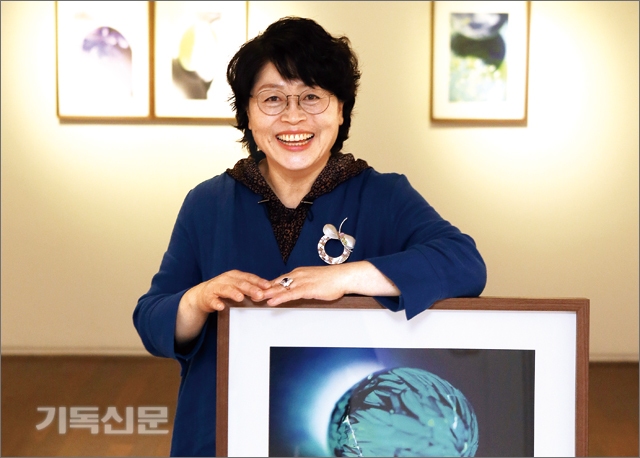
창조의 신비 품은 알은, 세계다
<데미안>서 착안, 5년 넘게 오리알과 씨름하며 다양한 빛 통해 창조세계 담아
소중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창조물 생명의 신비 렌즈로 알리는 일 순종할 터
처음에 봤을 땐 의아했다. 두 번째 봤을 땐 심오했다. 세 번째 봤을 땐 창조의 세계를 얼핏 이해할 수 있었다. 사진작가 정인수 씨(남서울교회·54)의 <알은 세계다>라는 작품을 보고 느낀 소감이 그렇다.
그는 풍경과 인물사진을 찍다가 불현듯 성경 속에서 작품을 찾기로 다짐을 하고 창의적인 작품에 몰두했다. 아무래도 풍경이나 인물사진은 정형화된 틀이 있기 때문에 보기는 좋아도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서지 않았다. 좀 더 창조적인 사진을 찍을 수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헤르만 헤세의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는 <데미안>의 한 대목이 떠올랐다.
“살아 숨 쉬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은 하나의 세계를 깨고 나와야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보이지 않는 무수한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한 세계를 깨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에는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그에게 작업의 모델이 되어 준 오리 알을 깨고 또 깨고, 그리고 또 깨고. 무려 5년 넘게 오리알과 씨름을 하며 빛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속에 감추인 무수한 창조물을 발견하고 떨리는 신비함으로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빛을 이용하여 알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합성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알 속에는 꽃 바다 나무 새 등 여러 모양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물들을 담았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재탄생 시켜봤습니다.”
그의 사진 작품에는 정말 다양한 형상들이 드러난다. 때로는 반쯤 깨져있는 알이 있고, 때로는 완전히 깨진 빈 공간의 남아있는 여백에 하나님의 사물들이 놓여있기도 하다. 계란 노른자를 사용하여 만든 정원도 눈에 띈다.
아무튼 그가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에덴동산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의 죄 짓기 이전으로 돌아가 살자는 것이다. 그가 ‘창조’에 눈을 돌린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는 말씀 때문이다. 그 속으로 가보자는 것이다.
그는 원래 음악교사였다. 16년간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소명감으로 일했지만, 막상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달았다. 특히 인성교육이랄까 생활교육을 감당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힘이 들었다. 영적인 제자로 키운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었다.
“제 자식이 커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학교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알고 사직을 했습니다. 솔직히 제 아이라도 바르게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는 서울 서초구 구민합창단으로 활동도 하고, 그림이 좋아서 동양화와 서양화에도 수 년간 몰두했다. 그러던 중에 사진을 찍으면서 자기계발과 더불어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미지와 만나서 새로운 형상으로 편집되어 나오는 사진을 볼 때 그는 창조의 현장이 따로 없음을 알고 벅찬 감동을 수 백번씩 느꼈다.

그에게 사진은 놀이터이자, 지상 천국이었다. 알을 깨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 기쁜 적은 없었다. 형언할 다른 뜻이 없을 정도였다. 2년 전, 항암치료를 받으며 생과 사의 갈림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치료 도중 얼마나 힘들었는지 쇼크사 상태였다고 합니다. 걸음을 걷거나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만 표현하는 작품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때부터 글 한 줄을 써도 성경을 찾아보고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신앙적인 체험을 한 후, 사진이 마치 자신의 분신인양 느껴졌다고 고백하며, 알이라는 화선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말씀과 풍경을 다 집어넣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여긴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알 속에 있는 생명의 잠재적 모습들의 상상력이 세상으로 나와 미적 효과를 더해가면서 새로운 질서를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발로 찍은 사진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찍은 것이다.
그가 이번에 선 보인 ‘별들의 탄생’은 껍데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들이 빛을 받아 별무리가 되었다는 소재로부터 착안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깃든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추구하며 예비된 성을 주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얀 세상’ ‘사랑의 열매’ 등에 나타난 그의 알 사진은 하나님과 교통하려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은밀하게 드러내는 수작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전시회 제목을 ‘Born Again’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 많은 형상들 가운데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물체와 이미지를 렌즈와 포토아이를 통해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Born Again’의 완성입니다.”
그는 진짜 사진을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며, 교회의 계단이나 의자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말했다. 평생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러려니 하고 다녔는데 주변의 모든 것이 신비롭고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며, 주님이 주신 시간을 최대한 아껴 쓰면서 순종하고 싶다고 얘기했다.
“제 작품을 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그것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앞으로 추상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토에세이도 함께 진행할 생각입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도 제 신앙의 깊이는 사진의 깊이와 함께 더해질 것입니다.”
한편 정인수 작가의 ‘Born Again’ 전시회는 4월 1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인사동길 갤러리 인덱스에서 열리고 있다.
글=강석근 기자 harikein@kidok.com 사진=권남덕 기자 photo@kid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