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천사와 악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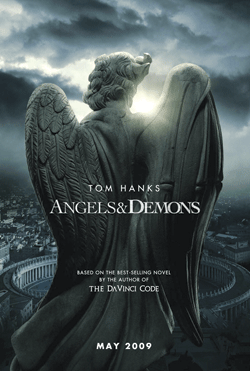
〈다빈치코드〉의 후속편 격인 〈천사와 악마〉는 분명 〈다빈치코드〉에 비하면 기독교에 대한 도발이 덜하다. 전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는 대담한 가설을 내세워, 가설이 진실이었다는 결말을 맺는 반면, 〈천사와 악마〉는 가톨릭교회의 탄압으로 사라진 ‘일루미나티’라는 비밀결사단체를 소재로 내세웠을 뿐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는다.
영화적 완성도 면에서 〈천사와 악마〉의 성과는 상당하다. 우선 유럽 원자핵공동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가공할 에너지인 ‘반물질’이 괴한에 의해 탈취당하고, 4명의 유력한 교황 후보들이 납치를 당해 차례로 죽어간다는 설정은 관객들을 긴장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하다. 볼거리도 다양하다. 로마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고풍스러운 성당과 아름다운 종교미술품, 장엄한 종교의식, 또 새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 과정이 고스란히 스크린에 담겨 관객의 시선을 모은다. 거기다 ‘일루미나티’의 상징인 앰비그램과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하버드대 종교기호학 교수인 주인공이 역사적 암호를 하나씩 풀어가는 장면은 기호학에 대한 호기심마저 자아내게 만든다.
전작에 비해 영화에 대한 거부감은 훨씬 적지만, 그럼에도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불편한 요소는 영화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영화 속 종교인들의 위선과 독선. 가톨릭 신부들은 스스로 낮아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달리 하나같이 욕심을 품고 있으며,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종교와 과학을 비교하는 시각 또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 영화 내내 종교는 과학을 도외시하고, 종교적 목적을 위해 과학적 사고와 성과를 깎아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반대급부로 과학은 종교에 못지않게 중요하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게 영화 속 주된 목소리다. 그러한 시선은 대사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종교는 흠이 많아. 인간 자체가 흠이 많으니까”라는 대사는 다분히 종교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인본주의적 시각에 근거하고 있다.
이 같은 불편함을 통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의 과제를 발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사회는 종교인들을 통해 종교를 바라본다는 깨달음.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키기 위한 나 먼저 참돼야겠다는 다짐으로 한번쯤 불끈 주먹을 쥐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