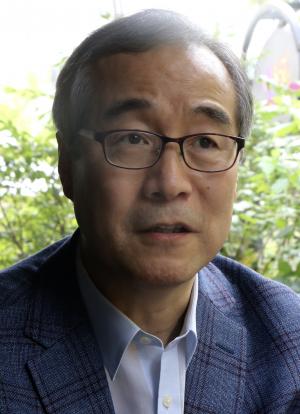성급한 행동 아닌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시작되는 실천 중요 … 조용히 머물며 묵상하는 유익 배워야
선한 사마리아인 실천과 주님 앞 마리아의 균형 유의하라
누가복음 15장에는 율법사와 주님의 대화가 있다. 그 대화에서 율법을 무엇이라 읽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율법사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읽는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 실천이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지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으로 등장한다.
누가 이웃이냐고? 질문이 틀렸다

대답의 핵심은 네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주님은 비유 속에 대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킨다. 이들은 비록 예배 관련 전문직이지만 강도 만난 자를 보자마자 피하여 지나간다. 그를 돌보아 준 사람은 뜻 밖에도 사마리아인이었다. 비유를 끝내며 주님은 묻는다. “누가 이 강도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인지를 물었으니 누가 너의 이웃이라고 대답하면 된다.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라고 물으신다.
초점이 딱 맞지는 않는 것 같은 대답을 통해 주님은 오히려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 무슨 말일까? 너희들은 누가 이웃이고 아닌지에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말이 아니다. 사람 중에 이웃과 이웃 아닌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웃되어 주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란 말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곤경당한 자들에게 이웃되어 주는 자들이 되라는 말이다. 결국 주님은 구약으로부터 줄곧 말씀하시던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삶, 즉 외모(민족, 학벌, 재산, 지위)로 차별하지 않고, 이웃의 형편과 처지에 공감하고 반응하며 살리는 것이다. 사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강도만난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 목사님은 좌파인가?
그런데 이런 본문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설교하면서, 그 ‘강도 만난 자’의 함의를 사회적 약자들로 구체적으로 확장하면 교우들은 금방 ‘우리 목사님 좌파인 모양이야?’라고 생각한다.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좌파를 구별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목사들까지도 그렇다.
성경과 마르크스-레닌 계열의 사회주의는 너무나 다르다. 성경은 따뜻한 이야기이지만 마르크스-레닌 계열의 사회주의는 살벌하다. 그것은 따뜻하게 보듬기보다 오히려 심한 분열과 갈등을 가져온다. 그들의 운동 에너지는 유산자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다.
그렇다고 그 반대쪽으로 도망쳐도 큰 소용이 없다. 자유주의 우파라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우파는 그 ‘자유’로 인해 사회에 활력을 가져오지만, 그 자유는 여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나 자유이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유가 아니다. 누구에겐 자유일지 몰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겐 소외다. 오죽하면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표현도 ‘Marginal people’ 즉 ‘여백에 사는 사람들’이겠는가? 그들은 여백에 얹혀서 살뿐, 그 페이지에 기록된 주요 이야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런 여백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다가가 치유하라는 말이다.
실천이 곧 ‘활동주의’는 아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그 비유 다음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에 놀란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실천을 강조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상반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앞에서는 “너도 가서 이 같이 하라”고 실천을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가 창피를 당하는 것 같고, 어이없게도 아무 일도 안하는 마리아가 칭찬을 듣는다.
하지만 이것은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실천이 무엇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우리의 실천은 주님 앞에 머물러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실천은 성급하고 경솔한 활동들이 아니라 차분히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데 시작되는 실천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다. 단순히 열정과 분량을 내세우는 우리의 기도는 마리아의 모습과 동 떨어진 모습일 때가 많다. 오히려 제멋대로 일을 벌여놓고 안 도와준다고 떼쓰는 마르다의 모습이 더 가까울 때도 많다.
주님 앞에 앉은 마리아의 모습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물러 그 분의 성품과 인격을 깊이 응시하면서 그 분으로부터 듣고 배우는 것이다. 주님도 말씀하셨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부터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조용히 주님 앞에 머물며 듣는 시간의 유익
그렇다면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분께 듣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주님의 아름다움을 봄으로 그 분을 사랑하게 된다. 둘째, 그 아름다움을 통해 영혼의 쉼과 회복을 경험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주말이면 산이나 들로 가는 이유와 같다. 그들은 왜 주말마다 산으로 가는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청량함을 볼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 자연은 주님이 지으신 것이다. 우리 주님께 진정한 아름다움과 신선함이 있다는 말이다. 사실 주님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진선미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분을 깊이 뵐 때 우리 영혼은 새 힘을 얻는다.
셋째, 우리는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보면서 그것을 배운다. 아름다움을 분별하려면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아야 한다. 수준 높은 아름다움을 보면 아름답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절로 알게 된다. 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무엇이 선인지 알려면 정말 선한 것을 많이 보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잘못인지를 저절로 느끼게 된다. 정치적 실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는 실천에 앞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앉아 차분히 그 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치고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그 때에도 먼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여야 한다. 왜 그럴까?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이다.
넷째, 우리는 주님 앞에 앉아서 그 분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각을 배운다. 그 분의 시각은 지으신 모든 것을 향한 따뜻한 시각이다.
다섯째, 그 앞에 머물러 그 아름다운 섬김을 보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한다.
여섯째, 주님 앞에 머물면 우리 안에 한껏 부풀었던 욕망들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잘못된 충동들도 다스려진다. 이것 없이 활동부터 하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기 쉽다. 그 분의 아름다움에서 오는 감동이 아니라 자신의 교양과 도덕심, 계획이 앞장서게 되어 결국 마르다처럼 남을 비난하며 정죄하게 된다.
먼저 ‘신 앞의 단독자’로 서라
일곱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머물면, 세상의 갈채와 환호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된다. 더 이상 지지자의 숫자에 연연하거나 그것을 정당성의 근거로 삼지 않을 것이다. 꽤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 함성을 질렀다고 해서 그것을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우를 범치 않을 것이다. 그런 논법으로 모든 걸 정당화하면 반대편 사람들도 거리로 뛰쳐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연기 같이 사라지는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를 자신에 대한 긍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그러다가 박수가 그치는 순간 삶의 의미를 잃고 목숨을 끊었는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분께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 주님으로부터 깊이 배우기 때문이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어느 날,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하지만 주님은 지지자들의 숫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을 하늘의 뜻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서둘러 제자들을 바다 건너로 보내시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갔다. 조용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분을 바라보기 위함이다. 그렇게 사셨기에, 어느 날 갈채가 끊어지고 “못 박으라”는 함성으로 돌변했을 때에도 주님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평소 진리이신 아버지께 나아가 그 앞에 머물러 그 분께만 집중하셨기 때문이다.
‘신 앞의 단독자’라는 개념으로 잘 알려진 키에르케고르는 정치 체제의 중대한 변화를 둘러싸고 민심이 소용돌이치던 시대를 살았다. 그 때 그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대중주의의 위험을 직감했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정치적, 사회적 요구를 쏟아내는 과정을 보면서 인간 내면의 폭력성이 위험스레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 때 그가 느낀 것은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치적, 사회적 운동은 늘 대중을 향해 손짓하지만, 대중은 윤리적 심판자가 되기에 너무 감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사람만이 참된 공동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분 앞에 설 때 자신의 추악함을 알고, 그 분의 두루 따뜻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이기적 편협함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 분노는 아무리 많이 모아도 정의가 될 수 없다.
광장의 대결이 한참 뜨거울 때, 혹자는 “집단지성이 이루어가는 위대함을 보라”고 열광했다.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는 집단은 개인보다 현명하다는 기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개인이 잘 모르는 것도 집단으로 해결해 가면 옳은 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대체로 옳은 말이다. 하지만 집단지성의 커다란 약점은 그 가운데 한 두 사람의 ‘전문적’ 선동가가 끼이면 손쉽게 악마로 돌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중 속에서도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오늘 우리의 교회들에서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서 나아가 그분 앞에 앉아 조용히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들음에서 우러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오늘의 위기의 중심에는 그것 없이 화려한 수사와 기법만 있는 강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