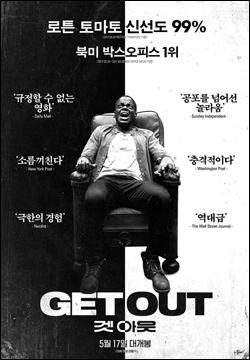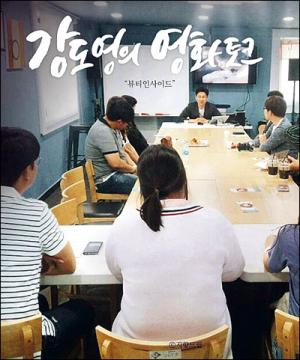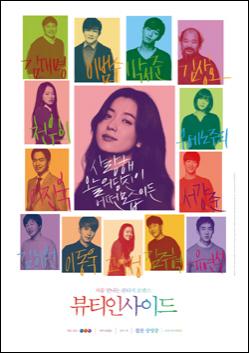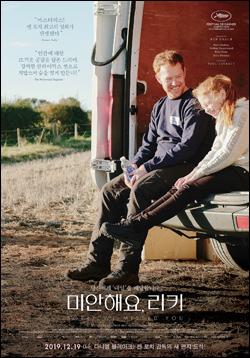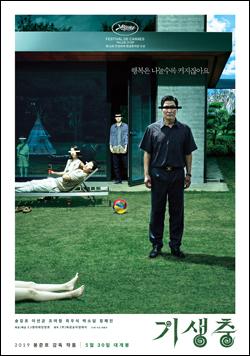(빅퍼즐 문화연구소 소장)
2014년 여름 영화 <프란시스 하>는 60개 정도의 스크린에서 7만여 명의 관객과 소통한 후 아쉽게 극장에서 내려왔다. 좋은 영화여도 관객이 쉽게 만나 볼 수 없는 예술 영화의 현주소가 영화에서 보여주는 주인공 청년의 현실과 맞닿아 있어 아쉬움은 더 크게 느껴졌다. 영화 속의 주인공 프란시스를 보면 볼수록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의 모습과 닮아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동네 뉴욕에 사는 27세 프란시스는 가난한 무용수이다. 정식 단원이 아닌 견습생으로 버틸 수 있는 건 무용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프란시스는 스스로와 나름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사실 그녀도 흔히 말하는 어린아이 같음을 벗어버리고 어른스러움의 옷을 입으려고 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타협을 모르는 프란시스는 끝까지 모든 사람과의 만남에서 자신을 내어준다. 프란시스에게는 존재의 방식이지만 다른 성인에게는 ‘이상한’ 모습이 돼버리고 만다.
성인의 세계에서 괴짜로 취급받는 프란시스는 과연 끝까지 어린아이 같음을 붙들며 자신의 꿈을 좇아갈까 아니면 이제는 성인으로서 적당히 타협하며 어른스러움의 옷을 입게 될까? 프란시스는 결국 자신의 무용 선생님으로부터 사무직 제안을 받고 사무실에서 직장인의 삶을 시작한다.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취미로 무용을 알려주는 강사 일도 놓지 않는다. 그렇게 일을 하니 자연스럽게 프란시스도 집을 마련한다. 그렇게 조금씩 어른의 옷을 입어가는 프란시스의 모습이 관객에게는 조금 어색해 보이기도 하지만 영화 내내 보였던 그녀의 불안한 모습과는 달리 직장인 프란시스는 무척 안정적이고 행복한 미소를 연신 보여준다.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단연코 프란시스가 자신의 집을 나서면서 우편함에 자신의 이름을 끼워 넣는 마지막 장면이다. ‘Frances Halladay(프란시스 할라데이)’. 당연히 자신의 이름을 모두 우편함 이름표에 넣어야 하지만 공간이 너무 좁아 이름이 다 들어가지 않는다. 꾸깃꾸깃 이름표를 집어넣다가 겨우 프란시스는 성을 접어서 Frances Ha를 만든다. 그렇게 방황의 마침표를 찍는 듯 보였던 프란시스는 원하던 모든 것을 얻은 듯 보이지만, 우편함에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반을 접어야 했다. 성인의 옷을 입으며 적절히 타협하면서 나름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그녀의 모습에 안도가 되지만, 한편으로 밀려오는 씁쓸함을 감출 수는 없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기독교에서 믿음의 핵심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다. 믿음은 미래가 현주소에 펼쳐지는 것이며 비록 보이지 않지만, 경험되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프란시스의 믿음은 탁월하다. 대부분이 미래를 포기하고 현실에 집중할 때 프란시스는 끝까지 꿈을 놓지 않는다. 미래를 나름대로 경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런 프란시스의 믿음을 주변은 좋게 보지를 않고 포기하라는 압력을 끊임없이 한다.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무용을 포기하고 일반 직장인의 삶을 선택한 프란시스는 믿음을 저버린 것일까? 아니다. 프란시스가 27세 이전에 생각했던 믿음의 모양이 27세 이후에 조금 달라졌을 수는 있지만,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다. 회사원으로 일하면서도 무용 강사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름을 다 넣을 수 없는 장애물이 생겼을 때 나름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극복해가면서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현재화 시키는 데 더 노련해졌을 뿐이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것을 도 아니면 모 식의 극단적인 표현방식으로 말할 때가 많다. 프란시스는 자신의 꿈을 향해 소소하지만 중요한 믿음의 선택들을 이어갔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 믿음의 바통을 소소하게 이어갈 수 있기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