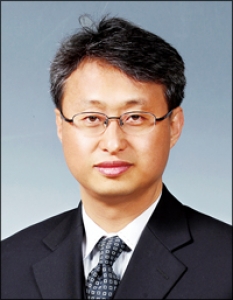박한결 목사(서울 신일고등학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봐라!” 며칠 전 수업을 마치고 한 학생에게 했던 말이다.
섬기고 있는 학교의 ‘기독교 교육’은 냄새만 풍기지 않는다. 학교의 분위기가 전통적으로 그러했고, ‘자율형 사립고’가 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오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다고, 학생 본인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고 예배를 빠지거나 수업에 열외가 될 수 없다.
종교 수업시간에 교사(교목)와 학생 사이에 서로 약속된 것 중 하나가 ‘다른 책 가져오지 않기’다. 그런데 한 친구가 계속 다른 책을 보고 있어서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지만 고치지 않았다. 수업 후 상담을 했다. 그런데 눈물을 보였다. “저는 불교신자인데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적인 지식을 배우고, 찬양의 가사를 따라 불러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눈물이 뚝뚝 흘렸다.
학생을 잘 다독거려 교실로 보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어려웠다. 학생들이 보기에 선생님들은 마음 상할 일 없을 것 같지만, 학생과 학부모로 인한 감정소모로 너무 힘든 자리다.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해 있다가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일반적인 답은 ‘전학’이다. 학교의 설립이념에 동의하지 않고, 이미 알면서도 선택했는데, 마음이 변해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다면 학교의 입장에서는 전학을 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답이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은 달랐다. “그러면 어떡하죠? 어떻게 그 친구를 변화시켜서 복음이 들어가게 할까요?”였다. 내 자신이 초라해졌다. 교목인 내 마음이 상한다고, 아무 충돌 없이 졸업시켜야겠다는 마음만 가득했던 나에게 교장선생님의 말씀은 충격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교장선생님이 있는 학교에서 같이 근무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얼마 전 학부모께서 교장실에 방문하셨다. 교장선생님께서는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시는 그분을 위해 미리 예쁜 성경책을 준비해두셨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교목인 나를 불러 기도해달라고 하였다. 이왕이면 그 부모님의 손을 성경책에 얹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런 기회를 마다하지 않고 앉아 진심으로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 불신자였던 그 학부모가 눈물을 훔친다. 가슴이 뿌듯했다. 그런데 고개를 돌려보니 교장선생님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다. 순수한 신앙을 가진 선생님을, 복음전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교장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어찌나 감사가 나오던지….
교목이라는 자리는 학교의 예배와 신앙활동을 책임지는 자리라는 측면에서 교회의 담임목사와 비슷하다. 하지만 행정적인 수장인 교장선생님의 역할과 구분되어 있어 교장선생님의 지원과 협조가 아니면 교목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교장의 자리에 어떠한 사람을 세우는가에 따라 학교의 영적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다. 그러한 상황에서 협력자이며 복음 전도자인 교장을 세워주심에 감사한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역사의 주관을 신뢰하며 오늘도 어떤 이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실까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