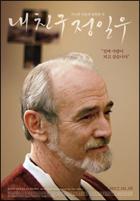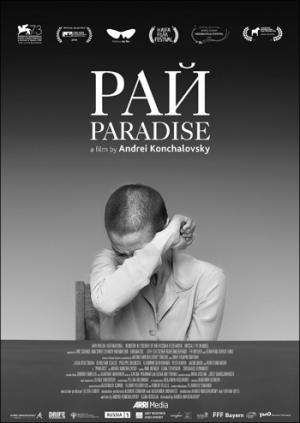<필름포럼 프로그래머>
일상 용품과 식료품을 파는 일본의 어느 평범한 마트 안. 아버지와 아들로 보이는 ‘시바타’와 ‘쇼타’가 마트 출입문 앞에 나란히 서서 서로 눈짓으로 리듬을 맞추는 동시에 마트 안으로 출발한다. 쇼타가 목표물을 포착하면, 아버지 시바타가 마트 점원의 위치를 손짓으로 사인을 준다. 그러면 쇼타는 자연스럽게 최대한 편안한 포지션을 취하며 물건을 가방에 넣는다. 원하는 생필품을 모두 챙겨 쇼타와 시바타는 유유히 마트를 빠져 나간다.

2018년 제71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어느 가족>은 찌는 듯한 올 여름 그렇게 관객들에게 들어온다. 산부인과에서 바뀐 아이들을 통해 부모의 성장통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본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로 2013년 칸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마침내 <어느 가족>으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다. 그는 초기작 <아무도 모른다, 2004>부터 <걸어도 걸어도, 2008>를 지나 <바닷마을 다이어리, 2015>와 <태풍이 지나가고, 2016>까지 일관되게 ‘가족’을 영화의 중요한 주제이자 ‘형태’로 표현한다.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혈연에서 출발하지만 히로카즈 감독의 가족은 그 형태를 이루는 모습과 관계의 과정에 초점을 둔다. 그리하여 가족의 의미를 잔잔하게 훑어내다가 관객의 보편적 감성을 날카롭게 찌른다.
<어느 가족, shoplifer>은 영어제목에서 말해주듯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어느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가족의 구성원들은 하나 같이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아빠 시바타는 본인의 성을 이 가족의 이름으로 내어준 존재일 뿐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일은 훔치는 일이다. 그래서 쇼타에게 훔치는 법을 가르친다. 쇼타는 집에서 공부 할 수 없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 학교라고 배우고 그렇게 믿는다. 여기에 새롭게 가족으로 편입된, 정확하게는 집에서 맞는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그것이 유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엄마 ‘노부요’가 데려온 아이, ‘유리’는 오빠 쇼타에게 마찬가지로 도둑질을 배우고 아주 훌륭히 해 낸다. 그리고 도쿄 변두리 아파트 사이에 낀, 누가 봐도 소위 재개발 ‘알박기’ 같은 이 가족이 거주하는 집을 소유한 할머니 ‘하츠에’는 전 남편의 손녀 ‘아키’를 데리고 산다. 혈연으로 전혀 엮이지 않은 어찌 보면 성인 버전의 ‘가출팸’ 같은, 세상에서 바라보면 사회 부적응자들이자 잠재적 위험 인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가족은 자기들은 행복하다.
찌는 듯한 무더위의 한 여름날 소면을 말아먹다가 갑자기 느끼는 사랑의 불꽃을 주체하지 못하는 시바타와 노부요는 아무도 없는 거실 마루에서 불꽃을 태운다. 온 가족이 피서를 간 어느 바닷가 해변에서 할머니 하츠에는 즐겁게 노는 가족들을 보면서 ‘모두 고마워요’라고 생에 마지막으로 속삭인다. 특히나 유리의 유괴 혐의와 하츠에의 시신유기 혐의로 당국에 취조당하는 노부요는 검사가 아이들이 당신을 뭐라고 불렀냐고 묻는 질문에, 아이들과 지나온 시간을 회상하며 밀려드는 회한을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조용하고 잔잔하게 울며 관객에게 답한다. ‘글쎄요’라고.
여기에서 관객은 내 가족을 돌아본다. 결국 이 가족은 중심인물인 노부요가 구속되면서 해체된 듯 보인다. 그러나 고레에다 감독은 아이들이 결국 ‘희망’이라고 말한다. 아마도 앞으로도 히로카즈 감독이 바라보는 가족은 가족을 이루는 ‘관계의 설정’에 더욱 깊게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내가 겪은 희로애락의 감정에 누가 함께 있었나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