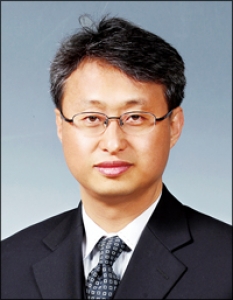정동건 목사(서울 재현고등학교)

가끔 목회자 지인들에게 웃으면서 도발할 때가 있다. “학교에서 한 번 설교하실래요?”
목회자에게 설교하라는 말이 도발이라니? 도대체 기독교학교의 채플은 어떤 분위기일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용할만한 곳은 체육관이나 강당 정도이다. 그런데 이곳에 전교생을 전부 몰아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대개 채플은 한 개 학년 정도만 참석한다. 그래도 기본 300~400명은 된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일반적인 교회의 중고등부 예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여학생들이 있는 경우, 예배는 그래도 활기찬 편이다. 찬양도 잘 따라하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학생들도 율동을 따라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재현고등학교는 아쉽게도 남학교이다. 300여 명의 머슴아들이 모여 있는 분위기는 예비군 훈련장과 다름 아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매주 정해진 날짜와 시간마다 학교에서는 예배가 진행된다. 학생들 중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10% 내외일 것이다. 특히 사춘기의 남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이다 보니 온갖 잡소리가 강당 전체를 휘감는다.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귀가 먹먹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교 한 번 하려면 정말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야 한다. 한겨울에도 얼굴에 땀이 줄줄 흐른다. 실제로 학교에 초대되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예배가 끝난 후, 교목들을 붙잡고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매주 하세요?”라고 하시면서 난감해 하신다. 그래서 “학교는 한국말이 통하는 완벽한 선교지나 다름없다”고 한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따로 있다. 그렇게 떠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아이들이 예배가 끝나면 내게 “선생님, 오늘 멋있었어요!” “목사님, 설교 은혜받았어요!”하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떠들어도 귀는 열어놓고 있다. 그러기에 ‘샬롬’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면, 아이들은 나를 보면 ‘샬롬’이라고 외친다. 결국 어떻게든 말씀은 아이들 귀에 들린다는 뜻이다.
지금도 수많은 교목들은 이렇게 사막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다. 이렇다보니 교목들의 모임을 관찰해보면 참 재미있다. 교목들의 관심사는 몇 가지 없다. 학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찬양사역자가 방문했었는지, 아이들에게 수업이나 예배시간에 어떤 자료들을 사용했는지를 서로 나눈다. 그리고 자료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기에 바쁘다. 주변에 교목 사역을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기에 서로 만나면 마치 전투 중에 흩어졌다 만나는 전우를 보는 것 같은 반가움과 애잔함이 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항상 예쁘기만 하겠는가.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원수 같은 때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미워도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일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이 ‘도떼기시장’같은 어수선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 터져라 복음을 들려준다.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다시 살아나길 기도하면서.
오늘도 교목들은 한 조각 기도를 가슴에 품고 아이들 속으로, 선교지로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