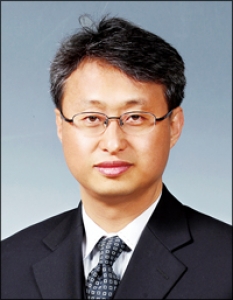박재윤 목사(쉐마기독학교)

“목사님, 우리 학교는 학교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돼요!” “목사님, 금요일에 집에 갈 때는 캠프 끝나고 집에 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다.
교육부 인가 받은 기독학교, 초·중·고등학생이 같이 있는 영어 많이 하는 대안학교, 그리고 기숙학교, 우리 학교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모임 시작에 기도하고 마무리를 기도로 끝내는 모임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교회나 신앙 공동체를 생각한다. 더욱이 하루를 말씀 묵상으로 시작한다면 당연할 것이다. 우리 학교의 교실, 모든 수업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다.
이른 아침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잠 많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면 신앙 공동체로서는 최고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학교의 자랑은 신앙교육이다. 청소년이라면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뛰쳐나가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 그렇지만 다시 자리에 앉아 또 예배당 맨 앞 강대상 근처에 무릎 꿇는 기특한 녀석들이 많다. 매일 그런 모습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점심시간 기도모임 때 예배실을 차지하기 위해 초등학생과 중고생이 서로 경쟁한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른다. 등교시간, 식사시간, 하교시간 등 시간만 있으면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다. 수요예배가 끝나면 많은 학생들이 설교자에게 기도 부탁하고 기도 받기 위해 한 시간씩 줄서야 하는 학교다.
찬양에 열정적이고 초등학생의 찬양 소리보다 더 크게 목소리 높이는 고등학생들, 고등 선배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높아지는 중학생들, 학생 찬양팀과 교사 찬양팀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은 감격적이다.
욕과 온라인 게임 이야기가 자연스럽고, 화장과 연예인이 대화의 전부인 것이 대한민국 다음세대 교육현장이다. 진로와 이성에 대한 고민이 상존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을 언제 불러도 어색하지 않게, 성경 들고 다니는 것을 입시 참고서처럼 꼭 안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 아니 많다.
완벽하지 않아 속상한 일도 많지만 쉐마기독학교의 학생들은 점점 변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학기가 진행될수록 욕하는 목소리는 줄어든다. 반대로 찬양의 목소리는 점점 커진다. 물론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회개하며 기도하다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 하는 걸 보면 좌절 할 때도 있다. 다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모습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말씀과 찬양 기도로 변화되어 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소망하곤 한다.
때로는 반복되는 예배 때문에 예배의 소중함을 잃을까 걱정할 때도 있다. 기도를 핑계 삼고 찬양팀 연습을 핑계 삼아 공부하지 않을까 걱정할 때도 있다. 하지만 염려는 이내 감사가 되고, 감사는 기쁨과 소망으로 변해간다. 이 학교의 목사인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교회에, 신앙 공동체에, 학교에 몸담고 있는 것이 뿌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