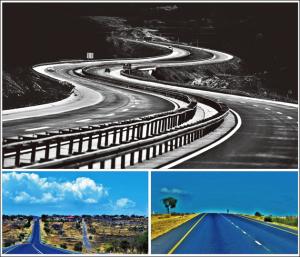[이규왕 목사의 아름다운 자연사진 이야기] (7)새 아침이 주는 메시지-울릉도 저동항의 일출
여명이 다가오는 새 아침이면 어두움을 걷어내고 동편이 서서히 밝아진다. 칙칙했던 바다를 점점 금빛으로 물들이며 불끈 솟아오르는 아침 해의 장관은 보는 사람들 모두의 탄성을 자아낸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 초하루의 일출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동해를 찾아 북적인다. 이 모습은 뉴스거리가 될 만큼 어느새 연례행사가 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해마다 송구영신예배와 신년예배를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럴 기회를 가진 적이 없다.
마치 용광로에서 갓 쏟아낸 쇳물처럼 붉다 못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마치 헬라어 알파벳의 ‘오메가’(Ω) 글자 모양으로 솟아오르는 해는 자연사진을 찍는 작가들의 로망이다. 물론 그동안 수많은 일출을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오메가 일출을 찍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바다에는 자주 구름이 끼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마주하는 기회가 마치 월척을 낚는 일처럼 쉬이 주어지지 않는다.
필자는 유별나게도 일출과 일몰을 좋아하기 때문에, 간혹 바다가 있는 지역으로 여행이나 집회를 가게 되면 일출을 사진에 담는 일이 최우선 순위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살피는 것이 일출을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이다. 이 포인트를 눈여겨 두었다가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일찍 잠을 청한다.
일출을 사진에 담으려고 할 때는 물론 오메가 형태로 찍는 것도 좋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 순간 지나가고 만다. 때문에 일출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섬이나 나무나 배 같은 배경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조인(釣人·낚시꾼)이 어디에 가면 대어가 잘 낚이는지 포인트를 찾아야 하는 것처럼, 자연을 찍을 때도 뷰포인트(view point)를 잘 찾아야만 아름다운 구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 울릉도에 있는 한 교회의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일이다. 일출을 사진에 담기 위해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날이 채 밝지 않은 저동항에서 적당한 뷰포인트를 찾아 기웃거리다가 마침 시장 건물의 옥상을 찾아냈다.
여명의 아침이 점차 밝아오면서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구름 사이로 아침 해가 솟아올랐으나 그렇게 염원했던 오메가는 볼 수 없었다. 해가 떠오른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살피던 중에 부지런한 갈매기 두어 마리가 아침끼니를 찾는 듯이 하늘을 날고 있었다. 항구에는 어선들이 닻을 내린 채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어느 부지런한 어부가 밤새 드리웠던 그물을 걷기 위해 파문을 그리며 출항하는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문득 부지런한 새가 아침을 굶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났다.
필자가 해오름과 해넘이를 좋아하는 까닭을 이야기하겠다. 아침 해가 어두움을 걷어내면서 점차 중천에 높이 솟아올라 만물을 환하게 밝히지만, 그 순간부터 해는 기울어지면서 서녘으로 저물기 시작하고 온 세상은 다시 어둠에 잠긴다. 이렇게 반복되는 하루가 어쩌면 인생의 축소판과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시 90:5)
비록 오래 전 찍은 사진이지만 기억을 더듬어 울릉도 저동항의 해돋이 사진을 다시 찾아본다. 지금 내 인생이 하루 중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돌이켜 보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다. 지금 나의 때가 아침 해나 중천에 뜬 해가 아니라 서쪽으로 기울어 가는 해와 같을지라도 서글퍼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노을이 깃드는 인생의 해넘이를 준비해야 할 때임을 생각하며 숙연한 마음을 가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