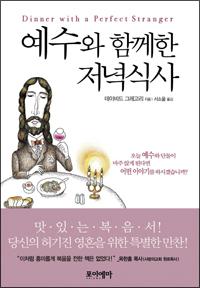송광택 목사(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소박한 밥상(헬렌 니어링 & 바바라 담로쉬, 디자인 하우스)
이 책은 스코트 니어링의 아내이자 미국의 유명한 자연주의자로 국내에도 널리 소개된 헬렌 니어링의 요리책이다. 니어링 부부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자급자족하며, 자연 친화적인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50년 동안 한 번도 의사를 찾은 일이 없었으며, 죽기 직전까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했다.
헬렌 니어링은 조리법을 참조하지 않고 화려한 식탁을 차리지 않는 소박한 여성이다. 저자는 미식에 빠지지 않는 검소하고 절제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소금을 넣지 않은 팝콘이나 버터와 잼을 바르지 않은 빵, 매콤한 소스를 치지 않은 샐러드가 입맛을 당기지 않는다면 그만큼 배가 고프지 않다는 얘기가 된다.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극적인 양념을 넣지 않고도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소금과 양념이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만든다면, 소금과 양념을 넣지 말고 음식을 적게 먹는 편이 좋다.”
저자의 말을 더 들어 보자. “몸에 음식을 공급하는 일에 그리 공을 들이고 시간과 힘을 그토록 많이 쏟아 부을 필요가 있을까? 식사를 간단하고 쉽게 하면, 그 준비에 들이는 노고가 한결 줄어들 것이다.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최소화하자.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자.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영양을 내자. 몸에 어떤 음식이 필요한지 알아두자.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이 필요할 것이다. 자연스럽고 적절한 식사법을 알아내서 꾸준히 실천하자. 나는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아주 단순화해서, 먹는 시간보다 준비하고 만드는 시간이 덜 걸리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게 합리적인 식사의 요건이 될 것이다. 30분이나 한 시간 동안 식사를 한다면, 음식 준비에 그만큼의(혹은 그 보다 짧은) 시간만 들이지 더 길게는 들이지 말라. 소박한 음식으로 소박하게 사는데 한결 가까워질 것이다.”
따라서 저자에 따르면, 맛보다는 영양가가 우선이다. 맛보다는 경제성과 준비의 편리함을 우선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말을 인용한다. “단촐하게 하라. 욕구를 절제하면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잔치하듯 먹지 말고, 금식하듯 먹으라. 식사를 간단히, 더 간단히, 이루 말할 수 없이 간단히–빨리, 더 빨리, 이루 말할 수 없이 빨리–준비하자. 그리고 거기서 아낀 시간과 에너지는 시를 쓰고, 음악을 즐기고 곱게 바느질하는데 쓰자. 자연과 대화하고, 테니스를 치고, 친구를 만나는 데 쓰자.”
저자는 자연이 차려준 식탁을 추천한다. 즉 샐러드 예찬론이다. 루이스 웅테르메이어는 “상추와 푸른 잎채소는 시원하게 정신이 들게 한다. 그것을 먹으면 마음이 차분하고 깨끗해진다”고 말했다. 알렉시스 소이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식욕이 떨어졌을 때, 심지어 배불리 먹은 후에도 샐러드처럼 신선한 게 어디 있으랴. 맛있고 싱싱하고 푸르고 아삭아삭하며, 생명력과 건강이 넘치며, 입맛을 돋우고, 더 오래 오래 씹게 하는 음식이여”(‘한 푼짜리 요리’ 중에서).
저자는 절약정신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록펠러처럼 돈이 많았다 해도 아껴서 경제적으로 살 것이다. 불을 끄고, 노끈이나 종이봉지, 포장지를 모아 두었다 재활용할 것이다. 재료가 풍부하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먹을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남은 재료를 분별 있게 모아서 재빨리 만든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요리가 된다.”
우리의 삶은 매순간 선택이다. 쉼 없는 선택의 길에 우리는 서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소모적인 삶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삶,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
독자는 이 책에서 ‘먹을거리와 먹는 행위’에 대한 헬렌 니어링의 독특한 철학을 만날 수 있다. 선택의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
■더 읽어볼 책
하나님, 그만 먹고 싶어요(리사 터커스트. 코리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