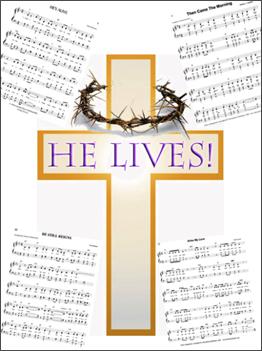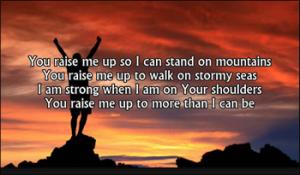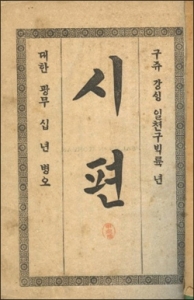“다 같이 찬송가 OOO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OOO장, 1절, 4절만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종종 듣게 되는 사회자의 말이다. 이는 교회 현장에서나 학교 채플에서나 마찬가지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축도 전 마지막 찬송을 아예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예배순서에 이미 그렇게 계획되어 있다면 그나마 문제가 덜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사회자가 예배 중에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몇 가지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적 예배에서 사회자가 임의로 예배 중에 그러한 결정을 해도 되는가? 예배의 대상은 만유의 주 하나님이시다. 공동체적 예배는 그 하나님께 공동체 전체가 사전에 공지된 순서에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배순서는 “이러이러한 순서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은 공동체의 다짐이자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배 중에 사회자가 임의로 예배요소와 관련된 어떤 변경을 시도해도 되는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있을 경우 기존의 어떤 것을 변경하고자 하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위 질문에 대한 답은 자명하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객관적으로 결례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더구나 그렇게 찬송을 한 절 또는 두 절로 줄여서 부르는 것이 예배 시간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그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다 해도 예배 시간 2~3분을 아끼기 위해 찬송을 줄이거나 생략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고백의 행위인 예배의 원리에 모순되기 때문이다.
찬송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찬송가 자체가 한 절 또는 두 절만 부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585장)이다. 만약 이 찬송을 1절만 부르게 되면 어떠한 내용으로 끝나게 될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원수 마귀를 천하에 누구라도 당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고백으로 끝나게 된다. 이것은 참으로 황당한 고백이다. 따라서 내용의 흐름상 이 찬송은 반드시 전체적으로 드려져야 한다.
찬송은 하나님과 그의 하신 일에 대한 찬양과 경배, 고백의 시(詩)이다. 일반적인 시 낭독에서도 첫 연(聯)만 낭독하고 그만두는 일은 없다. 시는 첫 연만 또는 처음과 끝 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음미해야 하는 것이다. 여느 다른 시들처럼 찬송가 가운데는 기승전결(起承轉結)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비근한 예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149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찬송을 한 절 또는 두 절로 줄여서 부르는 것이 타당한가? 또한 “전능왕 오셔서”(10장)의 경우, 1절은 성부, 2절은 성자, 3절은 성령, 4절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 중 일부만을 노래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바람직한 것일까?
기본적으로 찬송가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일부만을 드려야 한다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예배 중에 임의적으로 또는 즉흥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총신대 교회음악과 교수>